ABOUT
LECTURE
EXHIBITION
RESIDENCY
NEWS
CONTACT
● BOOK
1인분의 여행
베트남 호치민과 캄보디아 프놈펜, 씨엠립, 시하누크빌, 코 롱 삼로엠 섬…….
착하지 않아서 좋은, 가르치지 않아서 좋은 여행기!
담백하고 깊은 그 맛, 1인분의 여행을 떠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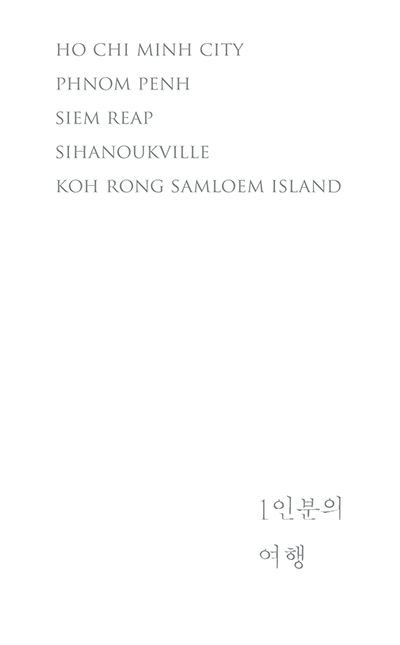
- 120*192
- 224p
- 13,000원
- 2013년 12월 31일
- 978-89-97835-41-6 (03810)
- 031.955.2675(편집) 031.955.1935(마케팅)
짠맛, 매운맛, 신맛…… 여행이 낼 수 있는 온갖 맛에 질려버린 당신이라면 작가 구희선의 여행기가 입맛에 맞겠다. 이 책은 세상의 행복, 기쁨,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근사한 풍경과 엮어둔 착한 여행기도 아니고, ‘세상은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하고 목소리를 내는 교훈을 주는 여행기도 아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여행을 ‘툭툭 던져주는’ 여행기이다. 그럼에도 이 여행기의 울림이 큰 까닭은 맛이 담백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행복이나 기쁨, 아름다움으로 제 여행을 수식하려 애쓰지 않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행간에 더하려 하지 않는다. 더하지 않고 뺌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향과 빛, 맛은 더 진해진다. 담백하고 깊은 구희선의 여행기는 맛이 좋다. 베트남 호치민과 캄보디아 프놈펜, 씨엠립, 시하누크빌, 코 롱 삼로엠 섬……. 그녀가 떠났던 1인분의 여행, 그러니까 혼자 떠나는 여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없는’ 것이 아니었다. 딱 한 사람 몫의 여행의 크기를 가졌던 그녀에겐, 여행지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오직 1인분만큼의 여행, 돌보아야 할 ‘네 몫’이 없는 자유롭고 심심한 여행에서 그녀는 마음을 열었다. 함께 곁을 나눌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맞이했다. 여행지의 인연에 커다란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귀한 인연을 밀어내지 않고 오롯이 나 하나를 향해 다가오게 하는 것. 1인분의 여행이다.
출판사 서평
착하지 않아서 좋은, 가르치지 않아서 좋은 여행기
세상에 착한 여행기는 많다. 여행지에서 마주했던 순간순간의 행복, 기쁨, 아름다움…… 그러한 것들을 모아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엮어두면, 누구든 보고 흐뭇해할 기분 좋은 여행기가 완성된다. 세상에는 교훈을 주는 여행기도 많다. 대부분 자신이 여행을 통해 보고 들은 것,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주며 ‘세상은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하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낸다. 삶의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전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책은 착한 여행기도 아니고 교훈을 주는 여행기도 아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여행을 ‘툭툭 던져주는’ 여행기일 뿐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참 울림이 크다. 담백하기 때문이다. 행복이나 기쁨, 아름다움으로 제 여행을 수식하려 애쓰지 않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행간에 더하려 하지 않는다. 남들이 더하려 했던 것들을 뺌으로써 맛은 담백해진다. 있는 그대로의 재료의 맛이 풍성해진다. 더하지 않음으로 고유의 향과 색채 맛은 더 진해진다. 그저 자신이 겪었던 여행의 장면들을 수식 없이 과장 없이 툭툭 내던짐으로써 담백한 맛을 낸다. 이로써 자신이 겪었던 바로 그 순간의 향과 빛, 맛은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구희선의 여행기는 맛이 좋다.
1인분의 여행, 오롯이 나 하나를 향해 다가오는 인연
저자 구희선이 이십대 이후에 떠났던 여행은 거의 1인분이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 ‘혼자 가면 재미없지 않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그녀는 ‘혼자 가도 재미있다’고 답한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더 심심해져야 해’라는 대답이 옳았을 것이라 말하는 그녀.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에는 꼭 치러야 할 값이 있는 법이고, 그 값이 그녀를 또 나가떨어지게 하고 다시 매달리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피로한 행보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온갖 재미로부터 떨어져 마음껏 심심해져야 할 때, 그녀는 1인분의 여행을 떠났다. 베트남 호치민과 캄보디아 프놈펜, 씨엠립, 시하누크빌, 코 롱 삼로엠 섬……. 그러나 혼자 떠나는 여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없는’ 것이 아니었다. 딱 한 사람 몫의 여행의 크기를 가졌던 그녀에겐, 여행지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오직 1인분만큼의 여행, 돌보아야 할 ‘네 몫’이 없는 자유롭고 심심한 여행에서 그녀의 마음은 열려 있었다. 그건 함께 곁을 나눌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한다는 말과 같았다. 여행지의 인연에게 커다란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귀한 인연을 밀어내지 않고 오롯이 나 하나를 향해 다가오게 하는 것. 1인분의 여행이다.
본문 중에서
- ‘1인분의 여행’ 중에서
“안녕, 잘 다니고.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감싼 그의 손이 내 등을 지긋이 눌렀다.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호치민으로 돌아올 테지만 그리고 나도 그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랐지만, 왠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애틋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벌써 추억이 되어버린다. 이미 지나가버려 생각으로밖에 쫓을 수 없는. “안녕, 나도 꼭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처럼 얘기했다. “다시는 못 보겠지만” 같은 단서는 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등을 똑같이 지긋이 눌러주었다. 그도 나에게 아주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 ‘안녕, JP’ 중에서 서
호스텔로 돌아와서 호주 청년과 시덥지 않은 얘기를 주고받다가 반달 얘기를 꺼냈다. 딱히 명쾌한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항상 약에 취해 비실거리며 행복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다녔다. 그저 나는 그 달이 계속 너무 어려웠고, 내 앞에 그 청년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 듯 말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달 방향이 반대야.” 그 말이 몹시도 근사해서 나는 좀더 오래 그와 얘기하고 싶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 다른 멋진 말도 알 것만 같았다.
- ‘일몰과 반달’ 중에서
그가 다른 얘기를 이어 가는데 나는 자꾸만 그의 얘기보다 억양에 신경이 쏠린다. 마침표를 소리로 만든다면 꼭 저럴 테지. 말의 꼬리가 단단하게 뭉쳐져 꾹, 하고 짓눌린다. 알파벳의 부드러움은 그의 입천장에 부딪혀 꺼칠한 돌기가 된다. 그가 하는 말은 무지 중요한 얘기같이 들리다가, 또 무지 시시한 농담같이 들린다.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니 러시아. 와, 러시아 사람은 처음 만나본다는 말에 자기도 한국 사람은 처음이라며 방긋 웃는다. 뭐야, 웃으니까 되게 착해 보이잖아.
- ‘카페, 느와르’ 중에서
그는 자신이 묵었던 호텔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얘기했다. 네모반듯하게 접힌 수건에서 풍기는 섬유 유연제의 향, 사붓이 살결에 닿는 하얀 면 이불의 차가운 온도, 발바닥을 기분 좋게 받쳐주는 슬리퍼의 단단하면서 말랑한 강도 같은 것들을 상상해본다. 여행 얘기를 하는 그의 표정은 소풍 갔던 얘기를 조잘거리는 소년 같기도 하고, 넉넉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 같기도 해서 때론 엄마처럼, 때론 손녀처럼 그의 여행 얘기를 들었다.
- ‘여행 이야기’ 중에서
- ‘땡큐, 슈가대디’ 중에서
차례
Prologue
vietnam - ho chi minh City
첫날의 상태
1인분의 여행
날씨 이야기, 사람들
날씨 이야기, 맛
다까오 할래?
아저씨, 노래가 슬퍼요
걸, 스모크, 베리 베리 배드
안녕, JP
한심한 하루
킹콩과 소년의 당구 경기
vietnam ~*~ cambodia
프놈펜을 세 번 지나친 사연
첫번째, 호치민에서 씨엠립으로
두번째, 씨엠립에서 시하누크빌로
세번째, 시하누크빌에서 호치민으로
cambodia - siem Reap
돈의 문제 #1
돈의 문제 #2
브레드 오믈렛, 플리즈
여행자의 저녁식사
그 지루함이나 자유로움, 혼자였던 시간들
일몰과 반달
번뇌가 사라지는 곳
충전
네 번의 시도
전날의 술자리
숙취와 일출
평지
여행 이야기
남근상 vs 여성의 요새
그들의 피서
cambodia - sihanoukville
시하누크빌로 향한 진짜 이유
카페, 느와르
그 남자네 집
채소 스튜와 치즈 오믈렛
소카, 소오카
정전
마음짐승
라이브 뮤직 나잇
cambodia - koh rong samloem island
이성과 책임감을 버려
웰컴 투 파라다이스
윌
섬
게으른 해변, 정글 그리고 발광 플랑크톤
그와 그녀의 이야기
굿바이, 아일랜드
땡큐, 슈가대디
epilogue
지은이
구희선
일단 지금은, 엔지니어. 한동안은 바텐더였고, 간간이 카페 언니였고, 잠깐은 낙지집 서빙 아줌마였다. 그리고 아주 오래 학생이었다. 졸업을 하고 나니 디자이너가 되었고, 디자이너를 그만두니 엔지니어가 되었다. 번잡했던,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번잡할 이력들은 손쓸 도리가 없지만 그 간극에서 나는 여행자였으면 한다.
All Rights Reserved
Website designed by Eunji Jo